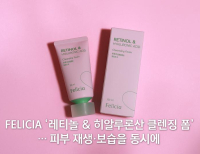고운실 칼럼니스트
고운실 칼럼니스트
 제주의 돌담따라 피어난 소담스런 메밀꽃. 사진=고운실 칼럼니스트
제주의 돌담따라 피어난 소담스런 메밀꽃. 사진=고운실 칼럼니스트
■ 메밀밭에서 피어난 약속
내 기억 속에 메밀은 따뜻한 풍경으로 남아 있다. 서늘한 기후에 잘 자라는 탓에, 부모님은 고구마 줄기가 말라버리면 그 대용으로 메밀씨를 뿌리셨다. 그러면 어김없이 양봉을 하던 이웃 삼촌들이 꿀통을 들고 와 메밀밭 가장자리에 두곤 했다. 덕분에 귀하던 꿀을 조금 저렴하게 얻을 수 있었고, 어머니는 아침마다 학교 가는 길에 내 입에 꿀 한 숟가락을 넣어 주셨다. 그 달콤한 맛은 나 혼자만 아는 등굣길의 웃음이 되었고, 지금도 어머니와 나만의 눈빛 인사로 기억 속에 남아 있다.
최근에 들른 한 메밀국수 집에서는 차가운 국수를 내기 전에, 주인이 먼저 뜨거운 메밀 반죽을 삶은 국물을 내주었다. 뽀얗고 슴슴한 그 국물은 차가운 성질의 메밀을 먹기 전, 속을 따뜻하게 하라는 주인의 세심한 배려였다. 식당 안에는 이 따뜻한 마음을 알아채는 손님들로 북적이는 것을 보면서.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 길이라는 것을 다시금 느끼며 메밀국수를 맛있게 먹고 나왔다.
메밀의 어원은 “산(뫼, 메)에서 나는 밀”이라는 뜻에서 비롯되었다. 척박한 산골에서도 빠르게 자라며 사람들의 끼니를 책임졌던 이 곡물은 우리 삶의 질곡 속에서 희망의 씨앗이 되어 주었다.흔히 메밀꽃 하면 흰색만 떠올리지만, 사실은 분홍과 붉은빛까지 다양하게 피어난다. 줄기 역시 초록에서 분홍, 짙은 붉은빛으로 물들고, 열매는 검거나 은빛, 혹은 갈색으로 여문다. 그 다채로운 색채 속에서 메밀은 단순한 곡물이 아니라, 사랑과 인연의 상징처럼 다가온다.
■ 민간 이야기와 기억 속의 메밀
메밀밭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가슴 속에서 절로 감탄사가 터져 나온다. 그래서인지 옛 문인들은 메밀꽃을 시의 소재로 즐겨 삼았다. 봉평의 가을밤, 메밀밭 사이를 거닐던 허생원의 이야기를 그린 이효석의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은 이제 한국 문학의 고전이 되었다. 그걸 입증이라도 하듯 봉평 일대에서는 메밀꽃이 만개한 8월 보름 무렵을 ‘혼인의 계절’이라 불렀다. 꽃이 밤에도 하얗게 피어 길을 밝혀주어, 마을 청년들이 짝을 찾고 혼인을 약속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그래서 메밀꽃은 연인의 약속, 인연의 매개로 회자되었다.
어쩌면 그래서일까. 치유의 관점에서 본 메밀은 옛 의서에서도 귀한 치유 곡물로 기록되어 있다. 『본초강목』은 오장의 노폐물을 없애고 정신을 맑게 한다고 했고, 『동의보감』에는 체기를 내리고 소화를 돕는다고 전한다. 현대 영양학에서도 단백질과 식이섬유, 비타민 B군, 철·마그네슘·칼륨·아연 등 미네랄, 그리고 혈관 건강에 좋은 루틴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다.그래서 메밀은 혈관과 소화를 돕고, 혈당 조절과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인 치유 곡물이다.
■ 자연치유의 식탁
①메밀전병 김치말이
[재료] : 2인분 기준
메밀가루 1컵, 물 1/2컵 (농도에 따라 가감), 잘게 다진 김치50g, 두부 1모 (물기 꼭 짜서 으깬 것), 당면 100g (불려서 삶아 잘게 썬 것), 대파 1대, 참기름 1큰술, 소금 약간, 후추 약간
[조리법]
•메밀가루에 물과 소금을 넣어 묽게 반죽한다.
•달군 팬에 기름을 살짝 두르고 반죽을 국자로 떠 넣어 얇게 부친다.
•속 재료(김치·두부·당면·파)를 볶아 양념한다.
•부친 메밀전에 속 재료를 올리고 돌돌 말아 완성한다.
강원도 농번기 음식으로 바쁜 농사철에 밥 대신 간단히 먹던 서민 음식이다. 밀가루보다 소화가 잘 되고, 김치와 두부가 들어가 단백질과 유산균이 풍부해 오늘날에는 웰빙 푸드 재발견이라고 할 수 있다. ‘검소하지만 영양이 가득한 한 끼’라는 상징성으로, 공동체의 협동과 지혜를 엿볼 수 있다.
②저염식 메밀 된장 비빔국수
[재료] (2인분 기준)
•메밀면(건면) 200g ,오이 1/2개, 상추 5장, 당근 약간,양파 1/4개, 김가루·깨소금 약간
•저염 양념장 : 집된장 1 큰술 (짠맛 강하면 2/3 큰술만), 다진 마늘 1 작은술, 매실청, 레몬 즙, 참기름 1 큰술, 깨소금 약간, 다시마 우린 물 또는 보리차 2~3 큰술 (간을 부드럽게 조절)
[조리법]
•끓는 물에 메밀면을 넣고 4분 정도 삶는다.
•찬물에 헹궈 전분기를 제거한 후 체에 밭쳐 물기를 뻰다.
•면에 참기름 몇 방울을 떨어뜨려 달라붙지 않게 한다.
•간을 보완하려면 : 참깨, 들깨가루, 표고버섯가루 등을 약간 섞으면 풍미는 살아나면서 소금 섭취는 줄어든다.
■ 인연을 위한 사랑의 약속
메밀은 언제 우리 곁에 들어왔을까? 기록에 따르면 고려 고종 대 『향약구급방』에 처음 등장하지만, 백제 유적지에서 탄화된 메밀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5세기 이전부터 이미 재배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오랜 세월 동안 메밀은 굶주림을 이겨내는 곡물이자, 잔칫상의 별미였다. 옛 성현은 “군자는 의로써 벗을 사귀고, 신의로써 벗을 지킨다”라 하였다. 인연과 약속은 우연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지켜내려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뜻일 것이다. 메밀이 척박한 땅에서도 꿋꿋하게 자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듯, 우리의 삶도 그러한 신의와 성실 속에서 아름답게 이어지길 바라본다.
오늘 우리가 식탁 위에서 만나는 한 그릇의 메밀국수, 무채와 쪽파 소를 넣고 둘둘 말아 제사상에 올리기도 했던 한 장의 제주 빙떡 속에는, 사람들과 나눔을 하며 긴 세월을 견뎌온 서사가 담겨 있다. 그래서 메밀은 우리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인연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왔다. 메밀이 보여주는 척박함을 뚫고 나온 끈기와 소박함, 그리고 다양한 빛깔처럼, 우연이 아니라 약속에서 비롯되었듯. 우리의 삶도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빛날 때 더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싶다. 이제 우리의 식탁 위에서 만나는 메밀 한 그릇은 인연을 위한 사랑의 약속 그 자체이길 소망해 본다.